-
뉴질랜드, 7월부터 1만2000개 이상 건축 자재들 국내 인증 필요 없어
- 통상·규제
- 뉴질랜드
- 오클랜드무역관 이보라
- 2025-07-10
- 출처 : KOTRA
-
뉴질랜드 정부 건축법 개정을 통해 경쟁 촉진, 급등한 건설비용 완화
7월 1일부터 석고보드, 단열재 등 주요 자재 등 국내 인증 불필요
뉴질랜드 정부, 해외 인증 건축 자재 수입 확대 위한 법 개정
뉴질랜드 정부는 2025년 4월 7일, 건축(해외 건축 자재, 표준 및 인증 제도) 개정 법안(Building (Overseas Building Products, Standards, and Certification Schemes) Amendment Bill)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2025년 7월 1일부터는 국제 표준 인증을 받은 해외 건축 자재에 대해 뉴질랜드 내 별도의 시험 없이 수입 및 사용이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국제 인증을 갖춘 제품이라도 뉴질랜드에서 추가 시험과 평가를 요구 받아 진입 장벽이 높았으나, 이번 조치는 이러한 장벽을 대폭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건설 자재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장기간 지속된 자재 가격 상승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크리스 펜크(Chris Penk) 건축·건설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올해에만 25만 개 이상의 건축 자재가 추가로 시장에 공급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통해 뉴질랜드 국민들이 주택 건설이나 리노베이션 시 더 다양한 선택권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2019년 이후 약 40% 상승한 건설 비용의 주요 원인이 자재 공급의 경쟁 부족에 있다고 지적하며, 제품 다양성이 확보되면 가격 안정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석고보드, 단열재, 지붕재 등 주요 구조·마감 자재 1만 2000개 이상이 면제 대상에 포함되며, 뉴질랜드 건설 산업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건축 개정안 주요 내용
개정법의 핵심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국제 표준을 건축법에 인용하고 인정하는 절차가 간소화된다. 석고보드, 단열재, 클래딩, 지붕재 등 주요 건축자재 약 1만 2000개 이상이 간소화된 절차의 적용 대상이다.
둘째, 뉴질랜드 각 지방의 건축허가기관(BCA)은 MBIE(기업혁신고용부)가 승인한 해외 인증 기관의 제품 인증을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하며, 추가적인 시험 없이 해당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단, 해당 자재가 의도된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될 경우에 한한다.)
셋째, 인정 범위는 공신력 있는 국제 표준 기반 인증으로 한정된다.
현재까지 뉴질랜드 정부는 해외 인증 기관 및 표준에 대한 공식 인정 리스트를 발표하지는 않았으나, 관련 인증 인정의 기준과 절차는 법적으로 명확히 수립된 상태이다. 정부는 2025년 하반기 중 관련 하위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인증기관 및 표준 목록을 가제트 공고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뉴질랜드 MBIE(기업혁신고용부)가 현재까지 언급한 국제 인증 예시로는 Standards Australia, BSI, ISO, ASTM 등이 있다.
<뉴질랜드 정부의 관련 안내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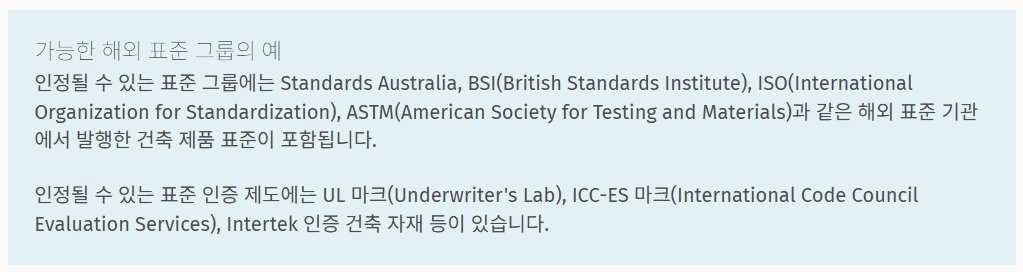
[자료: https://www.building.govt.nz/]
뉴질랜드 해당 건축 자재 시장 동향
1) 단열재(Insulation)
뉴질랜드는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건축법 5차 개정을 통해 건물의 단열 성능 기준을 대폭 강화한 바 있다. 이런 변화로 인하여 단열재의 수요는 높아졌으나 국내 생산은 극히 제한적으로, 수입산 단열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대표적인 단열재 품목으로는 폴리우레탄 폼(HS 392113)과 울 계열의 단열재(HS 680610)가 있다. HS 392113(폴리우레탄 폼)은 플라스틱 계열의 발포 소재로, 열전도율이 낮고 경량성이 뛰어나 건물 외벽 및 냉장 설비 등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뉴질랜드의 해당 품목 수입액은 2022년 약 752만 달러에서 2024년 약 933만 달러로 증가했다. 주요 수입국은 호주(37.8%), 스페인(18.6%), 중국(13.1%) 순이며, 한국은 1.5%의 점유율로 9위를 기록하고 있다. HS 680610(슬래그 울, 암면 및 유사 광물성 울)는 내화성과 내구성이 우수해 공공 건축물 및 고온 설비 단열에 주로 사용된다. 뉴질랜드의 해당 품목 수입액은 2024년 기준 약 473만 달러로, 주요 수입국은 폴란드(20.8%), 말레이시아(16%), 네덜란드(14.8%)순이다. 이 중 한국산 제품은 약 8.6%의 점유율로 6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은 고효율 단열재나 친환경 단열재 등 차별화된 제품으로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폴리우레탄 폼 부문에서는 한국 제품 비중이 아직 낮으므로, 향후 현지 유통망 확보와 국제 인증 대응 전략을 강화해 시장 진출을 꾀할 필요가 있다. 뉴질랜드 정부도 이번 인증 간소화 조치로 해외 단열재 도입을 더욱 장려할 계획인 만큼, 국내 기업의 전략적 진출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뉴질랜드 단열재 수입 동향>
(단위: US$, %)
폴리우레탄폼, HS Code 392113
순위
국가
수입금액
점유율
2022
2023
2024
2022
2023
2024
1
호주
2,670,519
2,849,977
3,525,223
35.5
33.0
37.8
2
스페인
1,244,849
1,846,121
1,732,958
16.6
21.4
18.6
3
중국
742,772
1,189,249
1,225,858
9.9
13.8
13.1
4
독일
108,667
1,264,916
1,181,852
1.4
14.6
12.7
5
미국
320,812
467,076
378,483
4.3
5.4
4.1
9
한국
194,212
106,576
140,915
2.6
1.2
1.5
전체
7,516,723
8,638,640
9,332,817
100.0
100.0
100.0
슬래그 울, 암면 및 유사 광물성 울, HS Code 680610
순위
국가
수입금액
점유율
2022
2023
2024
2022
2023
2024
1
폴란드
1,633,523
1,152,583
981,701
30.1
25.9
20.8
2
말레이시아
262,947
198,200
756,156
4.8
4.4
16.0
3
네덜란드
646,389
669,749
700,819
11.9
15.0
14.8
4
중국
527,731
748,727
692,721
9.7
16.8
14.6
5
미국
255,470
142,161
511,622
4.7
3.2
10.8
6
한국
1,083,072
587,478
405,146
19.9
13.2
8.6
전체
5,432,178
4,454,375
4,728,627
100.0
100.0
100.0
[자료: GTA(’25.6.30)]
2) 석고보드(Plasterboard)
그간 뉴질랜드 석고보드 시장은 Fletcher사 산하 GIB 브랜드가 90% 이상을 공급하며 사실상 시장을 독점적으로 주도해 왔다. 석고보드는 벽체 및 천장 마감재로 가장 널리 쓰이는 건축 자재 중 하나로, 내화성·시공편의성·가격경쟁력 측면에서 강점을 가진다. 뉴질랜드에서는 2021~2022년 초반 주택 건설붐과 공급망 차질 등이 겹치며 석고보드 병목 현상이 발생했고, 해외산 수요가 급증한 바 있다. HS 680911에 해당하는 석고보드의 뉴질랜드 수입 금액은 2021년 약 578만 달러였으나 2022년 약 1342만 달러로 정점을 찍은 후, 국내 생산 능력 확충으로 2023년에는 약 277만 달러로 급감했다. 2024년 기준 수입액은 약 290만 달러이며, 주요 수입국은 태국(67.3%), 호주(11%), 중국(9.5%) 순이며, 한국은 1.2%의 점유율로 7위를 기록하고 있다. 태국산 제품은 가격 경쟁력과 대량 공급 역량을 기반으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은 가격 중심의 대량 생산품으로는 태국 등과 경쟁이 어려운 만큼, 친환경·고기능성 프리미엄 제품이나 방습·방화 등 틈새 기능에 특화된 석고보드로 승부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현지 시장에서는 기존 브랜드의 높은 인지도와 보수적인 수요를 고려해, 차별화된 성능과 품질을 앞세운 마케팅으로 시장을 공략해야 할 것이다.
<뉴질랜드 석고보드(HS 680911) 수입 동향>
(단위: US$, %)
순위
국가
수입금액
점유율
2021
2022
2023
2024
2022
2023
2024
1
태국
2,065,717
5,881,920
1,982,063
1,954,671
43.8
71.5
67.3
2
호주
3,464,802
6,095,576
221,280
320,057
45.4
8.0
11.0
3
중국
172,131
1,150,665
245,483
277,124
8.6
8.9
9.5
4
UAE
-
180,244
186,257
152,627
1.3
6.7
5.3
5
미국
-
30
-
77,205
0.0
-
2.7
7
한국
31,021
61,284
135,806
33,567
0.5
4.9
1.2
전체
5,776,208
13,420,396
2,770,889
2,903,134
100.0
100.0
100.0
[자료: GTA(’25.6.30)]
시사점
이번 개정은 국제 인증을 보유한 해외 건축 자재의 뉴질랜드 시장 진입을 촉진함으로써, 한국을 포함한 해외 수출 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인증을 확보하고도 뉴질랜드 내 별도의 시험 및 절차로 인하여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었던 기업들에게 이번 제도 변화는 실질적인 진출 기반을 마련해주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뉴질랜드는 최근 탄소 중립 건축 확대, 에너지 효율 기준 강화 등 지속 가능한 건설을 중시하는 정책 기조에 따라 고기능성·친환경 자재에 대한 수요가 높으며, 특히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2022년부터 정부는 2500만 뉴질랜드 달러 이상 규모의 신축 공공 건물에 대해 친환경 건축 인증(Green Star, NZGBC가 운영하는 건물 환경성 평가 인증제도) 5-star(뉴질랜드 수준의 친환경 우수 설계(New Zealand Excellence)를 의미) 이상 취득을 의무화했으며, 2023년부터는 그 기준을 900만 뉴질랜드 달러 이상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또한 배출 감축 계획(ERP)을 통해 건설 자재의 전 과정 탄소 배출에 대한 평가 기준이 강화되면서, 에너지 효율성과 탄소저감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자재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프리미엄 단열재 및 친환경 석고보드 등 한국산 친환경 건축 자재의 수출 확대 가능성도 주목된다. 아울러, 뉴질랜드 정부가 주택 외에도 교육 및 보건 등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만큼, 현지 건설사 및 유통사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공공 프로젝트 수요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뉴질랜드 한인 건설 협회 강동훈 회장은 KOTRA 오클랜드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이번에 통과된 건축법 개정은 한국산 건축 자재의 뉴질랜드 시장 진출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다만, 제품의 성능 데이터, 국제 인증서, 품질관리 체계에 대한 명확한 문서화는 여전히 필수 요건인 만큼, 관련 기술 자료를 영문으로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 진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뉴질랜드 내 신뢰할 수 있는 현지 파트너와의 전략적 협업 또한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료: GTA, https://www.building.govt.nz/, KOTRA 오클랜드 무역관 자료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KOTRA의 저작물인 (뉴질랜드, 7월부터 1만2000개 이상 건축 자재들 국내 인증 필요 없어)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1
2025 베트남 중부진출기업 경영지원 세미나 참관기
베트남 2025-07-09
-
2
헝가리, 유럽 배터리 공급망의 핵심 허브로 부상
헝가리 2025-07-09
-
3
베트남 소방법 개정, 기업이 꼭 알아야 할 변화
베트남 2025-07-09
-
4
2025년 하반기 에스토니아 경제전망: 긴 침체에서 탈출 시도
에스토니아 2025-07-09
-
5
2025 한-인니 EV e모빌리티 비즈니스 플라자 개최기
인도네시아 2025-07-08
-
6
스타트업으로 알아보는 인도네시아 디지털 전환
인도네시아 2025-07-08
-
1
2025년 뉴질랜드 제조업 정보
뉴질랜드 2025-03-27
-
2
2024년 뉴질랜드 건설 산업 정보
뉴질랜드 2024-10-02
-
3
2021년 뉴질랜드 관광산업 정보
뉴질랜드 2021-09-30
-
4
2021년 뉴질랜드 ICT산업 정보
뉴질랜드 2021-08-11
-
5
2021년 뉴질랜드 낙농 산업 정보
뉴질랜드 2021-07-30
-
6
2021 뉴질랜드 산업 개관
뉴질랜드 2021-04-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