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레이시아 전력 요금 개편안 및 전력시장 진출 기회요인 분석
- 투자진출
- 말레이시아
- 쿠알라룸푸르무역관 최혜민
- 2025-07-22
- 출처 : KOTRA
-
2025년 7월부터 전력요금 개편, 현지 투자진출 기업들 비용 부담 예상
전력망 현대화 위한 프로젝트 및 인센티브 활용 권장
말레이시아는 2025년 7월 1일부로 전력 요금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요금 인상 차원을 넘어, 요금 산정방식 및 청구 항목을 구조적으로 재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이 개편의 목적을 “전력 공급 비용을 보다 정확히 반영해, 장기적인 에너지 공급의 지속가능성과 요금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 설명했다. 기존 요금 체계는 공급원가와 동떨어진 신호를 시장에 전달해 왔고, 이는 수요자에게 비효율적인 전력 소비 구조를 유도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전력 요금 개편은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추구하는 말레이시아 현 정부의 비전과 맞물리나, 현지 진출 기업들에게는 비용 부담의 증가로 다가온다. 이에 말레이시아 전력 시장의 동향과 전력 요금 개편안을 살펴보고, 우리 기업의 유의사항과 기회 요인을 점검해본다.
<말레이시아 전력 요금 청구서 샘플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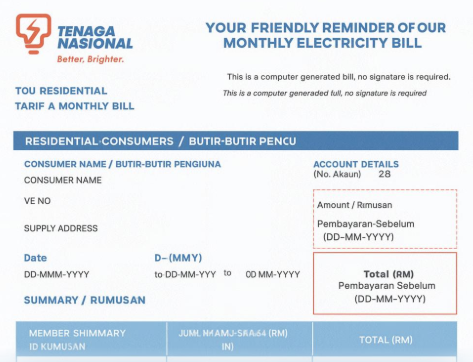
[자료: 챗GPT 가공]
말레이시아 전력시장 개요
말레이시아 전력시장은 주로 반도 지역(Peninsular Malaysia)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으며, 국가 전력공사인 TNB(Tenaga Nasional Berhad)가 송배전망을 독점적으로 운영한다. TNB는 발전 자회사를 통해 자체 발전시설도 보유하고 있으며, 독립발전사업자(IPP)의 전력 생산도 구매해해 도매 공급망을 형성한다. 사바(Sabah) 및 사라왁(Sarawak)주는 각각 SESB(Sabah Electricity Sdn Bhd) 및 SEB(Sarawak Energy)가 지역 전력공사로 기능하나, 전체 발전 및 송배전 정책은 중앙정부인 에너지전환부(Ministry of Energy Transition)와 에너지위원회(Suruhanjaya Tenaga, ST)가 관리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데이터센터, 반도체 패키징 및 전기차 배터리 공장 등 전력집약적 산업의 증가로 인해 산업용 전력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송배전 인프라 고도화 및 요금 체계 개편 논의도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탈탄소 목표 이행을 위한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와 민간 발전사업자 참여 확대, 해외직접투자(FDI) 유치 전략이 전력시장 개편의 주요 축을 이루고 있다.
2025년 기준 말레이시아 전력 생산의 약 81%는 여전히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석탄이 43%, 천연가스가 36%를 차지하며, 이는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자, 자국 LNG 생산능력과 연결된다. 반면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전체 전력 생산량 중 약 19% 수준이며, 그중 수력발전이 16%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보이고 있다. 태양광은 약 2% 수준이나, 최근 정부의 대규모 태양광 입찰(LSS)과 지붕형 태양광 보급 확대 정책을 통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말레이시아 에너지믹스>
(단위: %)
구분
2022
2023
2024
석탄
42.36
43.34
43.05
천연가스
37.28
36.86
36.68
수소
17.31
16.78
16.86
태양광
1.5
1.73
2.08
바이오매스
0.89
0.65
0.74
석유
0.67
0.63
0.60
풍력 ∙ 원자력
0.00
0.00
0.00
[자료: Angeas Association]
정부는 이러한 발전원 구조를 중장기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2025년까지 전체 전력설비용량 기준 재생에너지 비중을 31%까지 확대하고, 2035년에는 40%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또한 2050년까지 탄소중립(net-zero) 전환을 위한 국가에너지전환로드맵(NETR)을 수립해, 에너지효율화, 태양광 및 수소에너지 개발, CCUS 기술 확대 등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수급 구조는 말레이시아가 여전히 화석연료에 높은 의존도를 보이는 동시에, 탈탄소 전략을 통해 점진적인 구조 전환을 시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신재생 발전 설비에 대한 민간 및 외국인 투자 유치가 전력 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태양광 중심의 발전 프로젝트와 배터리 저장장치(ESS) 확대가 투자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전력 정책 변화 및 신에너지 비전 (2023~2025)
말레이시아 정부는 2023년부터 국가에너지전환로드맵(NETR, National Energy Transition Roadmap)을 핵심 청사진으로 삼고 전력산업의 대대적인 구조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NETR은 2050년 탄소중립(net-zero)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에너지효율화, 재생에너지 확대, 수소에너지 상용화, 바이오에너지, 전기차 확산, 탄소포집저장기술(CCUS) 등 여섯 가지 핵심 축을 중심으로 전략적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해당 로드맵은 단순한 선언이 아닌, 총 6370억 MYR(148억 USD) 규모의 장기 투자 수요를 전제로 하며, 외국인직접투자와 민간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2025년까지 발전설비용량 기준 재생에너지 비중을 31%로 상향하고, 2035년에는 4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정부는 역경매 방식의 대규모 태양광 입찰제도(LSS), 자가발전 초과분을 그리드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한 NEM(Net Energy Metering) 제도를 강화했다. 특히 NEM의 경우 상업 및 산업용 사용자(C&I)를 대상으로 총 1,000MW 규모로 확대되었으며, 이는 한국 기업의 자가발전 및 온사이트 태양광 설치를 통한 비용 절감 기회로도 연결된다.
전력망 측면에서도 말레이시아는 2030년까지 ‘국가 재생에너지 전력망(National Renewable Energy Grid)’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는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따른 전력 품질 저하 위험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아세안 역내 전력거래(ASEAN Power Grid) 기반 구축으로까지 연결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말레이시아 전력공사인 TNB는 인공지능(AI),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BESS), 스마트그리드 기술을 접목한 송배전망 고도화 계획을 수립하고 2025~2027년간 약 430억 MYR(100억 USD)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
에너지전환 정책의 기조는 단순한 탈탄소를 넘어 다음과 같은 3대 원칙에 기반하고 있다. 첫째는 탈탄소화와 에너지 안보의 균형이다. 정부는 석탄 사용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천연가스를 과도기 연료로 활용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를 통해 전력 안보를 확보하려 한다. 둘째는 전력 요금의 안정성과 시스템 신뢰도 유지이다. 산업계와 가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력 요금 체계를 재구성하고, 재생에너지 도입에 따른 불안정성을 최소화하는 기술적 보완을 병행 중이다. 셋째는 사회적 포용성이다. 에너지 접근성이 낮은 지역 및 저소득층을 고려한 ‘공정한 전환(fair transition)’ 원칙을 정책 설계에 반영하고 있다.
국제적 협력도 주요 전략 중 하나이다. 특히 탄소포집저장(CCS) 기술 및 ASEAN 전력망 연계 분야에서는 국제기구 및 주변국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를 탈탄소 전력 중심 허브로 성장시키기 위한 교차 투자 및 기술이전 프로젝트도 병행되고 있다.
결국 말레이시아의 전력 정책은 단기적인 설비 확대를 넘어 장기적인 저탄소 산업 구조 전환을 지향하고 있으며, 전력 인프라, 발전원, 요금구조, 제도환경 전반에 걸친 정책 개혁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이다. 이는 말레이시아 진출을 검토하는 한국 기업에게도 기술적, 재무적 관점에서 전략적 고려사항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말레이시아 전력 요금 개정안
현지 투자 진출 기업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이번에 시행되는 전력 요금 개정안이다. 2025년 7월 1일부로 시행되는 전력 요금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전력소비자 분류 기준의 변경이다. 기존 전력 요금은 소비자 유형을 크게 주택용과 일반용으로 구분, 일반용에서는 산업용·상업용·교육용 등 용처에 따라 구분하였다. 또한 카테고리 안에서도 전압 등급에 따라 나눠 전기세 카테고리를 A부터 H까지 구분해 카테고리별 전기세 요금이 별도로 책정됐다. 2025년 7월부터는 일반용에서 용처에 따른 세부 구분을 폐지하고 일반용과 주택용으로만 구분한 뒤 전압 등급을 기존 3등급에서 5등급으로 세분화했다. 농업, 하수처리 등 특수 분야를 제외한 일반 산업계 기준으로 전압에 따라 전기요금이 단순화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유사한 전압 등급을 사용하는 기업들은 업종과 무관하게 동일 요금군으로 분류된다.
<용처별 전력 소비자 분류 기준 신구 대조표>
개정 전
개정 후
전기세 구분
설명
전기세 구분
Tariff A
주택용
(Domestic Tariff)주택용
(Domestic General Tariff)Tariff B
저전력 상업용
(Low Voltage Commercial Tariff)일반용
(Non Domestic)Tariff C1~C4
일반~고전력 상업용
(Commercial Tariff)Tariff D
저전력 산업용
(Low Voltage Industrial Tariff)Tariff E1~E3
일반~고전력 산업용
(Industrial Tariff)Tariff H
농업용
(Agriculture Tariff)농업용
(Specific Agriculture)Tariff G~G1
가로등 및 기타
(Street Lighting, Neon & Floodlight)
가로등용
(Street Lighting)
Tariff F
광업용
(Mining Tariff)-
-
(신설)하수처리용
(Water & Sewerage)[자료: TNB,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종합]
<전압 기준 전력 소비자 분류 기준 신구 대조표>
개정 전
개정 후
구분
(전압등급)공급 전압 레벨
주요 산업군
(예시)구분
(전압등급)공급 전압 레벨
저전압
(Low Voltage)6.6kV 이하
- 소규모 제조업
- 소형 자동화 공장
- 소매 점포, 사무실 등 상업시설초저전압
(Extra Low Voltage)1V < V ≤ 50V
저전압
(Low Voltage)50V < V ≤ 1kV
중간 전압
(Medium Voltage)6.6kV < V ≤ 132kV
- 중규모 공장(전자부품 등)
- 냉동창고
- 중형 사무·데이터센터중간 전압
(Medium Voltage)1kV < V ≤ 50kV
고전압
(High Voltage)132kV 초과
- 대규모 제조시설
- 반도체 제조공장
- 광범위한 플랜트형 산업고전압
(High Voltage)50kV < V ≤ 230kV
초고전압
(Extra High Voltage)230kV 초과
[자료: TNB,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종합]
또한, 개정된 요금 구조는청구 항목(itemised billing)을 세 가지로 구분했다. 먼저 발전원가(Generation Charge)에는 연료비와 발전용량비용 등이 포함된다. 네트워크비용(Network Charge)에는 송배전망 유지 및 확장 비용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리테일비용(Retail Charge)는 고객서비스, 요금 청구, 계좌 관리 비용 등을 포함한다.
개정 전력 요금안에서 주목할 만한 사항은 자동 연료조정제도(AFA, Automatic Fuel Adjustment) 도입이다. AFA는 연료가격과 환율의 변동을 반영해 매월 ±3센(kWh당)의 요금 변동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이는 기존의 6개월 단위 연료비 정산(ICPT)보다 더 민감하고 신속하게 시장 가격을 반영하는 구조로, 국제 유가와 환율에 따라 기업의 전력비용이 실질적으로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전력 사용량이 많고 고압 수요를 갖는 대규모 제조기업의 경우, 에너지요금 단가는 낮게 유지되지만 기본요금은 상당히 증가했다. 반면, 중소규모의 저압 소비자는 기본요금은 비교적 높지만, 변동성 있는 연료비에 따라 전체 전력비용의 영향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이와 함께 ToU(Time of Use, 시간대별 요금제) 제도도 대폭 확대됐다. ToU는 피크 시간대(평일 오후 2시 ~ 10시)에는 높은 요금을 적용하고 비피크 시간대(오후 10시~다음날 오후 2시) 및 주말·공휴일에는 낮은 요금을 적용하는 구조로, 소비자가 사용 시간대를 조절해 전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설계되었다. 특히 2025년부터는 ToU 적용 대상을 저압 사업장까지 확대했으며, 스마트미터 설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oU 제도는 특히 운영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나 일부 제조업체에게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한다. 예컨대 냉장 유통, 세탁공정, 금속 가공 등 야간 작업 비중이 높은 산업군은 ToU를 활용할 경우 총전력비용의 10~15% 수준까지 절감 가능하다는 분석도 있다. 반면, 상시 가동이 필요한 반도체나 화학공정 등 고정 수요 기반 산업군은 기본요금 증가 및 연료비 조정의 이중 부담에 노출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에너지효율 인센티브와 자가발전 설비 연계를 함께 권장하고 있으며, 태양광 PPA, 가상에너지매니저(VEM) 시스템 활용 등 다양한 비용 절감 솔루션이 함께 안내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정책 대응이나 보조금 체계는 아직까지 제한적이며, 민간의 자구적 대응이 우선 요구되는 상황이다.
요약하면, 2025년 7월의 전력 요금 개편은 말레이시아 전력시장의 구조적 투명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시도이지만, 고압 산업 수요자에게는 전력 요금 총액 상승과 연료비 변동 리스크 확대라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투자 타당성 분석 시 전력비용 예측과 관련 리스크 완충 전략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말레이시아 전력 산업 투자 동향
말레이시아 국영 전력공사인 TNB는 전력시장 내 송배전망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핵심 사업자이자,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실행하는 주체로서 송배전망의 현대화 및 재생에너지 수용성 강화를 위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2025년부터 시작된 규제기간 4기(Regulatory Period 4, RP4: 2025~2027년)를 계기로, 전력망 투자는 정책적 중요성과 시장 수요에 따라 더욱 전략화되고 있다.
TNB는 향후 3년간 총 430억 MYR(100억 USD)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 중 다수는 스마트그리드 기술, 배터리 에너지 저장장치(BESS), 인공지능(AI) 기반 송배전 시스템, 그리고 디지털 계량기(AMI) 보급 확대에 투입된다. 이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적 공급 특성과 산업 수요의 고밀도화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하고 견고한 그리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히 눈에 띄는 변화는 '국가 재생에너지 전용 전력망(National Renewable Energy Grid)' 구축 계획이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비중을 40%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기존 전력망만으로는 불안정한 공급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새로운 전용 전력망은 재생에너지 전력의 계통 연계, 전력 품질 보장, 역송전(Reverse Flow) 허용, 전력 저장장치 연계 등을 통합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있다. 이는 향후 ASEAN 역내 전력거래 기반이 될 ASEAN Power Grid 연계 인프라의 일부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TNB의 중장기 투자계획은 아래와 같은 구조로 정리된다.
<TNB의 중장기 투자계획>
구분
투자계획
(MYR)
투자계획
(USD)
주요 내용
송배전망 현대화 (RP4: 2025–2027)
약 430억
약 100억
스마트그리드, ESS, AI, 디지털 계량기
장기망 투자 (2030년까지 누적)
약 900억
약 209억
National RE Grid 포함
[자료: TNB 공식 발표 및 관련 보도자료,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종합]
또한, TNB는 전력수요 증가에 대비해 연간 약 30~35억 MYR 수준의 송·배전 설비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데이터센터, 전기차 산업, 반도체 패키징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부하 밀도를 고려한 계획이다. 특히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 집중된 클랑밸리(Klang Valley), 페낭, 조호르 등 주요 산업벨트에는 고압 송전선로 확충과 변전소 자동화 시스템이 집중 도입되고 있다.
TNB는 이러한 인프라 개선 외에도 디지털 기반 에너지 운영 체계 전환을 통해, 고객이 스스로 소비량을 예측하고 조절할 수 있는 스마트미터 플랫폼(myTNB)을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전력 소비자 - 특히 중소 제조업체와 다중설비 운영자 - 는 전력 요금 절감 및 에너지효율 진단을 병행할 수 있는 실시간 정보 기반 환경을 갖추게 된다.
결론적으로 말레이시아 전력 인프라 투자는 단순한 설비 증설을 넘어, 디지털화, 분산형 전원, 재생에너지 중심 구조로의 전환을 명확히 지향하고 있다. TNB의 이 같은 투자 전략은 말레이시아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이자, 한국 기업이 스마트그리드 기술, AI 기반 계통설계, BESS·인버터 장비, 디지털 계량기 공급 등에서 진출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유망 분야로 주목된다.
전력산업 인센티브 및 외국인 투자환경
말레이시아 정부는 2025년부터 본격 시행 중인 에너지전환 로드맵(NETR)의 일환으로, 전력산업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를 위한 제도 개방 및 인센티브 체계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는 탈탄소 구조 전환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뿐 아니라, 기술·운영 영역에서 외국 기업의 참여를 유도해 시장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기조이다.
가장 주목할 제도는 CRESS(Corporate Renewable Energy Supply Scheme)로, 2024년 9월부터 시행됐다. CRESS는 중대형 기업이 전력공급사를 통하지 않고, 독립재생에너지 생산자(IPP)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전력을 장기 고정단가로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특히 재생에너지 인증서(Renewable Energy Certificate, REC) 발급도 포함돼 있어, ESG 경영을 추진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관심이 높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도 전력단가 예측 가능성 확보, 전력원 친환경성 확보라는 이중 효과를 노릴 수 있다.
또한 말레이시아 정부는 LSS(Large Scale Solar) 사업을 통해 대규모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에 민간과 외국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LSS는 말레이시아 에너지위원회(ST)가 주관하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운영되며, 2024년에는 약 2000MW 규모가 발주됐다. 특히 수상형 태양광(floating solar)의 경우 100% 외국인 지분 소유가 허용되어, 한국 기업이 직접 진입 가능한 사업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이 외에도 NEM(Net Energy Metering) 제도는 산업·상업용 소비자가 설치한 태양광 설비의 초과 생산 전력을 TNB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구조로, 특히 중소 제조업체의 비용절감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이를 한층 확장한 CREAM(Community Renewable Energy Aggregation Model)이 정책 검토 단계에 있으며, 향후 다수 공장이나 상가 단지가 공동으로 자가발전을 운영하는 모델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개방형 송전망(Third Party Access, TPA) 도입이 핵심이다. 2025년 9월부터 시행 예정인 이 제도는 독립발전사업자와 재생에너지 기업이 TNB의 국가 송전망을 이용해 전력을 제삼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는 사실상 말레이시아 전력망 독점 구조의 일부 개방을 의미하며, 발전·판매·송전 간의 기능적 분리가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구조적으로 이는 전력 PPA, VPP(Virtual Power Plant), BESS 연계 모델 등 첨단 전력운영기술의 민간 도입이 가능해졌음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외국인 투자에 유리한 세제 인센티브도 확대되고 있다. 2025년 예산안 기준으로는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수소에너지, CCUS 관련 설비 도입 시 투자세액공제(Investment Tax Allowance)와 소득세 감면(Partial Income Tax Exemption) 혜택이 부여되며, 이들은 대부분 말레이시아투자청(MIDA)에서 관리한다. 특히 조호르 싱가포르 경제특구(JS-SEZ), 클랑밸리 등 특별경제구역(SEZ)에 진출하는 경우 인프라 접근성, 통관 간소화, 법인세 감면 등의 부가 혜택이 적용된다.
<전력 분야 외국인 투자유치 제도 종합>
주요 제도/정책
내용
외국기업에 유리한 점
CRESS
민간 기업의 재생에너지 직접구매 제도
고정단가, REC 확보 가능
LSS
대규모 태양광 프로젝트 입찰제도
수상형 태양광 기준 100% 외국인 참여 가능
NEM
초과 태양광 전력 계통 연계 판매 허용
설비 설치 시 전력비 절감
TPA
제삼자 전력망 사용 허용 (2025년 9월 시행 예정)
독립발전 + 직접 판매 구조 가능
세제 인센티브
투자세액공제, 소득세 감면, CCUS 장비 특례
MIDA 통한 승인, SEZ 지역 가점
[자료: MITI 발표자료, MIDA 공고 등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종합]
결과적으로 말레이시아 전력산업은 TNB의 계통운영 독점이 유지되는 구조 속에서도 전력 생산과 거래에 있어 외국인 참여 공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관련 인센티브 체계도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단순 EPC 수주를 넘어, 재생에너지 생산·거래 플랫폼 구축, PPA 모델 설계, ESS 연계 운영 등 고부가가치 영역까지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셈이다.
한국 기업의 유의사항 및 시사점
말레이시아 전력시장은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면서도, 전통적인 국영 독점 구조를 유지하는 이중 구조적 특성을 갖는다. 전력 요금 체계 개편, 신재생에너지 전용망 구축, 제삼자 전력거래 도입 등 구조 개방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송배전망의 독점성과 제도 접근의 복잡성은 외국계 기업에게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
가장 현실적인 리스크는 2025년 7월부로 시행된 전력 요금 개편이다. 비가정용 사용자 중 특히 고압·초고압 전력 수요 기업의 경우, 기본요금 증가와 AFA에 따른 매월 변동 요금 부담이 동반되며, 생산비용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전력비용의 장기 예측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점에서, 진출 예정 기업은 사전 전력 수요 분석과 함께, 요금제 선택(ToU 포함), 자가발전 설비, PPA 계약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반면, 제도 개방에 따라 장기적인 기회 요소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CRESS(재생에너지 직접 구매제도), LSS(대규모 태양광 프로젝트), 제삼자 송전망 개방(TPA) 등은 기술력과 자본력을 갖춘 한국 기업에게 유리한 진출 기반이 될 수 있다. 기존 EPC(설계·조달·시공) 방식의 수동적 참여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 생산자·운영자·소유자로서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여지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또한 TNB 중심의 송배전망 고도화 사업은 향후 2030년까지 누적 900억 MYR(약 210억 USD)에 달하는 시장으로 추정되며, 스마트그리드, ESS, 고압 기자재, 디지털 계량기, AI 통합 설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요가 발생한다.
결론적으로 말레이시아 전력시장은 전력 요금 구조 불확실성과 제도 접근 장벽이라는 리스크를 갖는 반면, 제도적 개방과 인프라 투자 확대를 통한 기회요소도 병존하는 이중 구조적 시장이다. 따라서 한국 기업은 단순 수주 전략에서 벗어나, 현지 요금제 구조 분석, 제도 활용 전략, 기술-운영 통합 모델 구축을 통해 보다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진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자료: TNB, MIDA, MITI, Angeas Association, the star, the edge, reuters, business times, free malaysia today, bloomberg, MYC, New Straits Times, PWC Malaysia, Asean Business News, BNM,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KOTRA의 저작물인 (말레이시아 전력 요금 개편안 및 전력시장 진출 기회요인 분석)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1
필리핀 경제특구(PEZA)투자 723억 페소 기록, 한국 제조업 투자 1위
필리핀 2025-07-21
-
2
2025년 상반기 수출기업이 주목해야 할 크로아티아 경제·산업·제도 변화
크로아티아 2025-07-22
-
3
말레이시아, ‘페로실리콘’ 新공급망 허브로 부상
말레이시아 2025-07-18
-
4
인도네시아 전력 시장 동향 및 현황
인도네시아 2025-07-10
-
5
전력 수요 늘어나는 베트남... 장비 수출 및 프로젝트 진출 기회 확대
베트남 2025-07-22
-
6
인도네시아 절연전선케이블 시장동향
인도네시아 2025-07-22
-
1
2025년 말레이시아 반도체산업 정보
말레이시아 2025-06-10
-
2
말레이시아 전기차 산업 현황과 향후 전망
말레이시아 2024-08-13
-
3
2024년 말레이시아 스마트 농업 산업 정보
말레이시아 2024-04-09
-
4
2021년 말레이시아 ICT산업
말레이시아 2022-01-14
-
5
2021년 말레이시아 자동차 산업 정보
말레이시아 2022-01-13
-
6
2021년 말레이시아 신재생에너지 산업
말레이시아 2022-01-13













